2021 졸업여행(울릉도 여행) - 6
작성자
최껄껄
작성일
2021-10-29 11:38
조회
640
7. 넷째 날-현포동 고분군과 태하 등대(울릉도 등대)
오늘 길잡이는 태욱이와 병희이다. 오늘의 일정은 현포동 고분군과 태하 등대에 가는 것이다.
우리 숙소는 북서쪽에 위치에 있는데, 고분군과 대하 등대 모두 숙소 근처였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역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길잡이인 태욱이와 병희가 아침을 준비했다. 어제 잡았던 뿔소라도 함께 먹었다. 뿔소라는 태욱이가 내장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여 먹기 좋게 손질을 해놓았다.

오늘은 하루 종일 걸어야 해서 물이 필요했다. 숙소에 정수기가 있었지만, 물이 졸졸졸 나와서 병희가 들고있는 패트병에 물을 채운 후, 필요한 학생들이 덜어갔다. 친구들을 위해서 병희가 물을 채웠다. 역시 길잡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발 전, 다른 학생들은 각자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치원이와 아진이가 오목 두는 것을 재서가 구경을 하더니만, 잠시 뒤에는 재서와 아진이가 오목을 두었다.

연수는 날 좋은 울릉도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맞고 있었다.

길잡이들은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팬케이크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모자를 것 같았다. 태경이가 와서 도왔다. 아이들은 금세 모여 상의를 하더니 전도 같이 하자고 했다.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이른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서 기분 좋게 점심 상 앞에 앉았다.
밥기도를 하고 펜케이크와 전을 먹기 시작했다. 전에 들어간 고추, 부추, 파는 숙소 뒤편에 있는 텃밭에서 가져왔다. 손님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심어놓으셨다고 한다.

계획이 약간 달라졌지만, 우리는 서둘러 정리하고 길을 나섰다.

하늘이 맑고, 파도소리도 맑다. 바람도 맑고 아이들 얼굴도 맑다.
연수와 병희가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괜찮겠느냐고 물어도 괜찮다고 한다. 오늘 많이 걷는데, 괜찮냐고 해도 괜찮다고 한다. 교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두 번 묻고 확인도, 염려도 전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 거다(이날 두 학생은 슬리퍼 끈에 피부가 쓸려 상처가 났다.).
그렇게 30분쯤 걸었더니 고분군이 나왔다.

기대했던 것보다 작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약 15분쯤 머물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다. 숙소 사장님께 통발을 빌려왔는데, 어제 낚시 했던 곳에 통발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울릉도 바다는 정말 맑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맑은 바다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태경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통발은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문어 한 마리 잡아서 꼭 먹고야 말겠다는.
우리는 장소에 도착했고 통발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끼를 가져오지 않았다. 소라 내장을 잘 분리해서 두었는데, 통발만 가져온 것이다. 태경이와 재서가 마음을 내기로 했다. 어제 내려왔던 산길로 다녀오기로 했다. 태경이 특유의 시크한 말투. 괜찮아요. 15분이면 가요. 정말 둘은 30분만에 숙소를 다녀왔다.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기대를 담아 통발을 던져놓았다. 내일 왔을 때에는 문어와 회로 먹을 수 있는 몇 마리 생선이 담겨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는 서쪽 태하 등대로 가야했다.
가는 길에 울릉도 엿을 파는 커다란 상점을 보았다. 그곳에는 호박들이 광활하게 쌓여있었다.

이곳에서 호박엿 네 봉지를 사서 아이들과 나누어먹었다.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이었다.
엿을 우물우물 먹으며 등대를 향해 걸었다. 지도에서 보았을 때와 우리가 실제 걸을 때의 체감이 달랐다.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태하 등대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보았다. 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 가파른 산길을 오르려니 가쁜 숨이 나왔다. 중간에 앉아서 잠시 쉬어갔다. 병희와 연수의 발이 걱정되어서 몇 차레 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한계점이 거의 이를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태경이는 내려갈 걸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이 말에 사실 깜짝 놀랐다. 내가 스물 한 살 때 대청봉을 오르며 똑같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동아리에서 지리산에 갔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다. 태경이도 아마 30년 쯤 뒤에는 산을 좋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뒤에 보이는 것이 태하 등대(울릉도 등대)이다. 사실 이곳보다는 여기서 우리 숙소쪽(동쪽)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절경이다. 대풍감이라는 곳을 끼고 멀리 해안선을 따라서 수평선이 펼쳐져있는 풍경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멋지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연수가 있는 왼쪽 다리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다. 아이들이 별 감흥 없이 다녀왔지만, 나는 아찔해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내려갔다. 산 아래까지 가면 사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로 했다.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사장님을 기다리며 한 장 찍어보았다. 울릉도에는 집집마다 이런 풍경이다.

숙소 앞에서 보는 풍경.
오늘 저녁 노을도 예쁘다. 많이 걸었지만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였다.

오늘도 저녁은 글쓰기를 했다. 아이들은 이 시간도 즐기는 것 같았다. 내 글을 낭독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즐거워했다. 우리는 같은 지점에서 함께 웃기도 했고, 미소짓기도 했다.
돈독해진다는 것은 이런 느낌일까?
오늘 길잡이는 태욱이와 병희이다. 오늘의 일정은 현포동 고분군과 태하 등대에 가는 것이다.
우리 숙소는 북서쪽에 위치에 있는데, 고분군과 대하 등대 모두 숙소 근처였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역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길잡이인 태욱이와 병희가 아침을 준비했다. 어제 잡았던 뿔소라도 함께 먹었다. 뿔소라는 태욱이가 내장까지 깨끗하게 제거하여 먹기 좋게 손질을 해놓았다.

오늘은 하루 종일 걸어야 해서 물이 필요했다. 숙소에 정수기가 있었지만, 물이 졸졸졸 나와서 병희가 들고있는 패트병에 물을 채운 후, 필요한 학생들이 덜어갔다. 친구들을 위해서 병희가 물을 채웠다. 역시 길잡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발 전, 다른 학생들은 각자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치원이와 아진이가 오목 두는 것을 재서가 구경을 하더니만, 잠시 뒤에는 재서와 아진이가 오목을 두었다.

연수는 날 좋은 울릉도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맞고 있었다.

길잡이들은 아침을 먹고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팬케이크를 하려고 했으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모자를 것 같았다. 태경이가 와서 도왔다. 아이들은 금세 모여 상의를 하더니 전도 같이 하자고 했다.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이른 점심을 먹고 출발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서 기분 좋게 점심 상 앞에 앉았다.
밥기도를 하고 펜케이크와 전을 먹기 시작했다. 전에 들어간 고추, 부추, 파는 숙소 뒤편에 있는 텃밭에서 가져왔다. 손님들을 위해서 사장님이 심어놓으셨다고 한다.

계획이 약간 달라졌지만, 우리는 서둘러 정리하고 길을 나섰다.

하늘이 맑고, 파도소리도 맑다. 바람도 맑고 아이들 얼굴도 맑다.
연수와 병희가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 괜찮겠느냐고 물어도 괜찮다고 한다. 오늘 많이 걷는데, 괜찮냐고 해도 괜찮다고 한다. 교사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두 번 묻고 확인도, 염려도 전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 거다(이날 두 학생은 슬리퍼 끈에 피부가 쓸려 상처가 났다.).
그렇게 30분쯤 걸었더니 고분군이 나왔다.

기대했던 것보다 작았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약 15분쯤 머물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다. 숙소 사장님께 통발을 빌려왔는데, 어제 낚시 했던 곳에 통발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울릉도 바다는 정말 맑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맑은 바다가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태경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통발은 아이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문어 한 마리 잡아서 꼭 먹고야 말겠다는.
우리는 장소에 도착했고 통발을 설치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끼를 가져오지 않았다. 소라 내장을 잘 분리해서 두었는데, 통발만 가져온 것이다. 태경이와 재서가 마음을 내기로 했다. 어제 내려왔던 산길로 다녀오기로 했다. 태경이 특유의 시크한 말투. 괜찮아요. 15분이면 가요. 정말 둘은 30분만에 숙소를 다녀왔다.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기대를 담아 통발을 던져놓았다. 내일 왔을 때에는 문어와 회로 먹을 수 있는 몇 마리 생선이 담겨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는 서쪽 태하 등대로 가야했다.
가는 길에 울릉도 엿을 파는 커다란 상점을 보았다. 그곳에는 호박들이 광활하게 쌓여있었다.

이곳에서 호박엿 네 봉지를 사서 아이들과 나누어먹었다.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일품이었다.
엿을 우물우물 먹으며 등대를 향해 걸었다. 지도에서 보았을 때와 우리가 실제 걸을 때의 체감이 달랐다.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태하 등대 가는 길'이라는 이정표를 보았다. 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 가파른 산길을 오르려니 가쁜 숨이 나왔다. 중간에 앉아서 잠시 쉬어갔다. 병희와 연수의 발이 걱정되어서 몇 차레 더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정말 그런가보다 생각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한계점이 거의 이를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태경이는 내려갈 걸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이 말에 사실 깜짝 놀랐다. 내가 스물 한 살 때 대청봉을 오르며 똑같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동아리에서 지리산에 갔을 때도 같은 말을 했었다. 태경이도 아마 30년 쯤 뒤에는 산을 좋아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뒤에 보이는 것이 태하 등대(울릉도 등대)이다. 사실 이곳보다는 여기서 우리 숙소쪽(동쪽)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절경이다. 대풍감이라는 곳을 끼고 멀리 해안선을 따라서 수평선이 펼쳐져있는 풍경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멋지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연수가 있는 왼쪽 다리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다. 아이들이 별 감흥 없이 다녀왔지만, 나는 아찔해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곳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내려갔다. 산 아래까지 가면 사장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로 했다.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사장님을 기다리며 한 장 찍어보았다. 울릉도에는 집집마다 이런 풍경이다.

숙소 앞에서 보는 풍경.
오늘 저녁 노을도 예쁘다. 많이 걸었지만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였다.

오늘도 저녁은 글쓰기를 했다. 아이들은 이 시간도 즐기는 것 같았다. 내 글을 낭독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즐거워했다. 우리는 같은 지점에서 함께 웃기도 했고, 미소짓기도 했다.
돈독해진다는 것은 이런 느낌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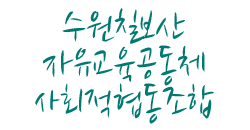
저는 서른 전까지 그랬던것 같아요.. 다시 내려올걸 뭐하러 올라가냐고..ㅋㅋ
지금은 좋아합니다 산행.
아진이는 오목을 좋아하고 연수는 눕는것을 좋아하고 참 평화로운 여행입니다 내일 통발 대박을 기원합니다~~